'조씨고아'·'귀토' 등 250여편 작업한 무대디자이너 이태섭
"공연 첫인상 결정하는 건 무대…배우가 편한 무대는 좋은 무대 아냐"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막이 오른 무대에는 잔잔한 수면이 펼쳐져 있다. 무대를 채운 물이 빠져나가면서 대지를 닮은 넓은 단이 드러나고, 배우들이 등장하며 극이 시작된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공연하는 국립창극단의 창극 '리어'는 독특한 무대로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2022년 초연 이후 2년 만의 재공연이다. 영국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비극 '리어왕'을 각색한 이 작품에서 '물'은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빚어낸 비극을 때로는 극적으로 때로는 관망하듯 그려낸다.

셰익스피어의 원작에 노자의 '물의 철학'을 엮어낸 건 극본을 쓴 배삼식 작가지만, 무대에 물을 들여온 건 무대디자이너 이태섭(70)이다.
이태섭은 창극, 연극, 뮤지컬, 무용 등 250편 넘는 작품의 무대를 만들어왔다. 커튼으로 둘러싸인 반원형 무대의 연극 '조씨고아', 1천500여개 각목을 촘촘하게 이어 붙여 무대 전체를 경사진 언덕으로 만든 창극 '귀토' 등 그의 무대는 상징과 은유로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1일 국립극장에서 만난 이태섭은 "대본 자체가 물로 시작해 물로 끝난다"며 "원작에도 리어왕이 천둥 치고 비 오는 황야를 헤매는 등 인간의 심리를 자연에 은유한 부분들이 많다"고 물을 무대에 사용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물론 대본에 물이 나온다고 해서 꼭 무대에서 물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극의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해낼 것인지는 연출과 무대디자이너의 선택이다. 각종 기계와 전선들이 얽혀있는 무대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태섭은 "사실 처음에는 글로시한 바닥 재질에 조명을 비춰 반짝이는 물의 느낌을 내는 보편적인 방법을 생각했다"며 "하지만 연출과 논의하면서 실제 물을 담아보는 방향으로 가게 됐다"고 뒷이야기를 전했다.
"사는 곳 근처에 큰 호수가 있어서 관찰을 많이 했어요. 물 위에 떠 있는 나뭇가지 같은 것들을 사진 찍어 연출한테 보내기도 했죠. 이런 물의 모습들을 무대에서 재연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무대에는 총 물 20t이 쓰인다. 폭 14m 깊이 9.6m 크기의 달오름극장 무대는 마치 수조처럼 물이 채워진다. 물은 바닥에서 15㎝ 높이 정도까지 차게 된다. 물은 공연 때마다 물탱크에 연결된 호수와 펌프를 통해 채우고 빼낸다. 무대에는 방수 처리를 하고 방수포도 여러 겹으로 덮어 혹시라도 있을 사고에 대비했다.
물의 높낮이와 흐름 변화는 작품의 심상과 인물의 내면을 표현한다. 수면 위에 드러난 단은 흔들리거나 기울어지고 물에 잠겼다 드러나기를 반복하고, 배우들은 물을 헤치며 걷거나 뛰고, 넘어져 허우적거린다.
이태섭은 "무대에 흙, 불, 물 자연적인 것을 들여올 때가 있는데 특히 물은 다루기가 어렵다"며 "혹시 물이 새기라도 하면 기계가 고장 날 수 있지만, 요즘은 무대 기술 자체가 많이 발전해 이런 두려움 때문에 시도를 못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극의 흐름에 따라 물이 채워지고 빠지는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테스트를 여러 번 했다"며 "배우들이 물 위에서 연기하고 춤추는 만큼 안전 문제도 각별히 신경 썼다"고 덧붙였다.
공연에서는 수중전투 장면이나 글로스터가 물을 튀기며 오열하는 장면 등 물이 만들어내는 장관들을 볼 수 있다. 이태섭은 물의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난 장면으로 처음과 마지막 장면을 꼽았다.
그는 "막이 오르면 무대가 물속에 잠겨있는 듯 보이는데 이게 마치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듯한 느낌을 준다"며 "이후 물이 빠져나가고 이야기가 펼쳐지다가 리어와 딸 코딜리어가 죽고 나면 다시 무대에 물이 채워지면서 우주처럼 고요해진다"고 귀띔했다.
"무대 위에 자연을 들여오면 그게(자연이) 연기를 해요. 무대와 안 어울리는 이질적인 요소가 만들어내는 힘이 있죠. 재밌을 거예요."

1990년에 데뷔해 30년 넘게 무대를 만들어온 이태섭은 중앙대 회화과를 졸업했다. 우연히 교육방송(EBS) 세트 디자이너로 일을 하게 됐다가 무대로 터를 옮겼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 고립된 미술 작업이 재미가 없었다"며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면서 하는 작업이 재밌겠다 싶었다"고 순수미술에서 무대미술로 업을 바꾸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대는 무대디자이너만의 것도 아니고 연출만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가장 먼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무대디자이너의 몫이라고 했다.
이태섭은 "후배들에게도 작품 첫 미팅을 할 때 무대디자이너가 맨손으로 달랑달랑 가면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된다고 말한다"며 "작가, 연출, 배우 등 모두 머릿속에 상상한 공간이 있지만, 그걸 현실로 구체화하는 시작이 바로 무대"라고 힘줘 말했다.
또 "관객들에게도 막이 오르고 나타난 무대의 모습이 그 공연의 첫인상을 결정짓게 한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태섭의 무대는 배우들을 힘들게 하기로도 정평 나 있다.
그는 "평범한 공간에서 움직이는 건 별로 재미도 없고 임팩트도 없다"며 "가파른 경사를 오르내리면 더 긴박해 보이는 것처럼 무대는 연기를 위한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배우들이 내 무대를 힘들다고 불평하기도 해요. 하지만 편한 무대는 좋은 무대라고 할 수 없죠. 배우를 나태하게 만들 수 있고, 연기도 돋보이지 않게 하거든요."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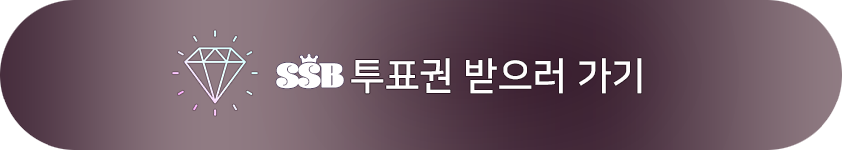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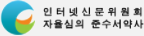
 1일 투표권 3개 받기
1일 투표권 3개 받기